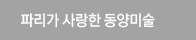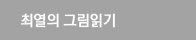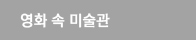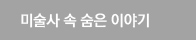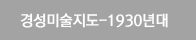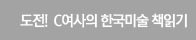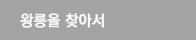메자닌 전시실 모습
외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 운영에서 부러운 것 중 하나는 십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는 장수 관장의 존재이다. 대영박물관의 닐 맥그리거 관장은 15년을 재직했다. 테이트 모던의 니콜라스 세로타는 28년이나 있었다. 유명 미술관의 이런 장수관장 전통에 프랑스도 뒤지지 않는다. 루브르의 앙리 루와레트 전관장 역시 13년을 이끈 뒤 내려왔다.
한 관장이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면 미술관은 저절로 성격이 생기기 마련이다. 세르누치도 마찬가지이다. 세르누치가 죽은 뒤 미술관을 맡은 리더는 앙리 다르덴 드 티작(Henri d'Ardennes de Tizac, 1877-1932)이었다. 그는 1905년에 큐레이터로 처음 세르누치에 발을 들여놓아 1932년에 관장인 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햇수로 28년 동안 세르누치를 지켰다.
그가 큐레이터였을 때만해도 미술관 성격은 불분명했다. 세르누치가 자신의 취향대로 물건을 모았기 때문에 컬렉션 내용이 들쭉날쭉했다. 티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들을 끌어들였다.
이때 합류해 그를 도운 사람들은 쟁쟁한 파리의 동양학자들이었다. 프랑스의 동양학 전통은 그 역사가 매우 깊다. 1822년에 설립된 아시아 학회(Société asiatique)에서 시작된다. 20세기 들어 이 학회가 중심이 돼 파견한 중앙아시아 탐험대의 조사, 발굴 성과가 잇달아 세상에 소개되면서 파리는 일거에 유럽 동양학계의 중심이 됐다.
이때 주역으로 활약한 학자들이 대거 세르누치를 도왔다. 돈황 막고굴에서 당나라 때의 고문서, 서화를 찾아내 일약 스타학자가 된 폴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를 비롯해 사마천의 『사기』를 서양 언어로 처음 번역한 에두아르 샤반느(Édouard Chavannes 1865-1918) 그리고 의사이자 시인이면서 아마추어 고고학자였던 빅토르 스갈랑(Victor Segalen 1878-1919)이 그들이다.
이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티작은 세르누치를 중국미술 전문미술관으로의 컨셉을 분명히 했다. 방향이 일단 정해지자 티작은 기존의 컬렉션을 재정리했다. 이때 컬렉션 하한선을 원나라 이전인 13세기로 정했다. 작은 시립 미술관의 한계를 일찌감치 인정하고 집중을 선택한 것이다. 그가 정착시킨 이 방향은 최근까지 지켜지며 주요 컬렉션은 고대 청동기, 한나라 부장품, 당의 불상과 당삼채 등으로 꾸며지게 됐다.
요나라 고분에서 출토된 남자귀족의 데드마스크
그중 12세기 거란 귀족의 분묘에서 출토된 남녀의 금동 데드 마스크는 티작이 하한으로 정한 요(遼 907-1125)의 문물을 대표하는 명품이다. 이들 마스크는 요나라 귀족의 장례 풍습을 반영하듯 모두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다. 1980년대에 서로 다른 무덤에서 출토돼 유럽으로 건너왔다. 미술관에 들어온 것은 공교롭게 모두 2001년이다.
각기 다른 후원자가 미술관에 기증했다. 여성 가면은 로튀 마에(Lotus Mahé) 부부가 기증했고 남자 마스크는 에콜 드 보자르에서 멀지 않은 센느가의 골동상 크리스티앙 데디에(Christian Deydier) 부부가 기증했다. 티작은 1922년 어느 미술관보다 앞서 미술관 회를 만들어 후원 조직을 체계화함으로서 이런 기증을 유도했다. 로튀 마에는 세르누치의 미술관회 부회장이기도 했다.
세르누치의 중국미술품을 세 발 솥에 비유하면 그 한 쪽 발에 해당하는 고대청동기 역시 여러 기증자에 의해 완성됐다. 10여명 이상 되는 기증자 이름 속에 유럽 화단에서 거장 대접을 받는 중국현대화가 자우키(赵无极 1920-2013)의 이름도 보인다.
중국현대화가 자우키 기증의 청동유물
항저우 출신인 그는 1946년에 세르누치가 기획한 중국 신진화가 전시에 초대됐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2년 뒤에 파리로 건너왔다. 그 뒤에도 세르누치에서 개인전을 열면서 호안 미로와 피카소로부터 상찬을 받으며 파리 화단의 주목을 받으며 정착하게 됐다.
그는 파리 활동에 발판을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는 세르누치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기증했다. 자신의 그림은 물론 피카소와 클레, 에른스트의 그림 90여점도 사후에 기증했다. 이 사후 기증품 가운데 중국 청동기도 들어있다. 청동제기는 전설처럼 들리는 은나라 시대의 제사에 쓰인 물건이었던 만큼 중국미술품 가운데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것이며 또 그런 이유로 정통성을 인정받는 유물이다.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정신적인 자부심을 느끼는 대상이기도 하다.
자우키는 1949년 중국대륙이 공산 통일된 이후에 홍콩을 통해 중국미술품들이 서구 세계로 흘러나오던 시절 이를 모았다. 1960년대 이후부터 수집한 그의 청동기 컬렉션은 아미타여래상 아래에 놓여있는 별도의 장식장 속에 전시돼 있다.
에어버스사가 기증한 방호(方壺)
청동제기 중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기업인 에어버스사에서 기증한 것도 있다. 높이가 49.3cm나 되는 대형 방호(方壺)이다. 은나라 수도인 안양(安陽)에서 출토된 것으로 BC13-12세기경에 제작됐다. 원래 미국인 컬렉터의 소장품으로 2000년에 시장에 나온 것이다.
프랑스의 중국미술 전문가들 사이에 이 청동기는 화제가 되면서 프랑스 국내에 이런 사각 형태의 청동 항아리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프랑스의 에어버스사는 학계의 이런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이를 구입해 세르누치에 기증해다. 현재 이 방호는 세르누치를 대표하는 소장품의 하나로 도록 등의 표지를 장식하고 있다.(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