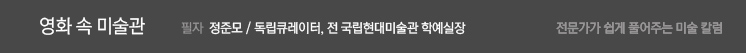글/ 정준모
역사가 된 개인의 삶
프레데릭은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청빈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집에 있는 코로의 그림이나 공예품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그 의미를 설명해준다. 그러나 아이들은 별 무관심이다. 되려 프레데릭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되뇌이는 것이라는 느낌이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빛살 좋은 자연 속에 놓여있는 집과 아름다운 꽃병과 가구보다는 모바일 게임이나 힙합에 더 관심이 크다. 전통을 중시하는 예술의 나라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다. 결국 영화의 끝머리에 큰 손녀가 모든 것이 흩어진 할머니의 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파티를 여는 것은 현실 그대로이다.
세계화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이버상의 국경과 문화의 붕괴로 나타났고 문화산업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이 미국화되어가는 혼종 현상, 힙합과 팝문화가 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지나간 시대의 유물은 말 그대로 지나간 세대의 삶의 기호이자 삶을 공유하는 매개지만 문화로서의 가치는 그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다면 요즘세대가 부정한다고 해서 문화의 표징인 미술품들도 모두 사라져야하는 것일까. 미술품이란 마치 지층처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기억의 켜가 쌓여진 결과물이다. 기억이란 단순하게 과거의 일을 기록해두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변하는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경험의 질료로 작동한다. 한 사람의 기억들이 쌓여 인생을 이룬다면 한 사회의 기억들이 모여 역사가 된다. 무엇을 기억할지 어떻게 기억할지에 따라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달라진다. 따라서 미술관과 박물관은 개인의 수집 노력을 통해 지워질 수 있는 개인적인 유산을 추출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가 기억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후대에 물려줄 정신적 자산이 무엇이고 우선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다. 사실 지금은 미술관에서 신화화되어있는 작품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개인의 단순한 일상용품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물건들이 선택과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쳐 역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위를 통해 축적된 상상적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집단인 사회, 지역, 국가는 지속되는 것이다. 영화는 그런 점에서 미술관의 역할과 소장품의 의미를 단순하게 아름다운 미술품의 한계를 넘어 동시대와 동세대의 공통 유전인자를 추출하는 것과 같다.
영화가 끝 부분에 이르면 아이들이 뛰어 놀다 깨뜨린 드가의 조각 파편들을 미술관의 콘서베이터(conservator)가 모아 아주 정교하게 복원을 해놓는다. 기억은 쪼개진 조각 파편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져 버릴 수 있지만, 전 세대에 대한 기억과 사랑, 즉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 기억과 역사가 복원된다. 이를 공유함으로서 하나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에서 국가도 존속할 수 있는 것이다.
드가 <오른 발을 들고있는 발레리나> 1900-1903
이런 무거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록과 보존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게 한다는 점은 매우 유익하다. 사실 많은 국가들이 이런 기억의 보존과 기록의 가치를 중시하며 이런 일을 위해 국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는 지원에 만족해야 한다. 기록과 보존을 위한 선택은 철저하게 독립적이며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라는 행위가 국민국가 수준으로 규범화하면서 획일화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영역이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국가주의나 국민국가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영화에서 드가의 파편화한 조각 작품이 다시 하나로 환생하듯 그 시대를 구성했던 무명의 삶이라할 지라도 그의 삶의 조각들이 역사를, 미술사를 구성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