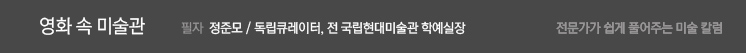글/ 정준모
어머니의 집안 한 구석에선 깨어진 드가(Edgar De Gas, 1834~1917)의 조각상이 비닐봉지에 담겨 나오고 어머니의 소박하지만 품위 있는 삶을 지켜준 것들은 다름 아닌 이런 미술품과 아르누보스타일의 세간, 도구들이었다. 이런 작은 사치는 이혼하고 화가인 삼촌을 뒷바라지하며 사는 한 여성의 무거운 삶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비록 고가의 뛰어난 품격을 갖춘 명품들이지만 어머니의 삶이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집안에 필요한 물건을 고를 때는 하나라도 제대로 된, 예술적 가치와 공예로서 손맛이 살아있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돈이 많아 값비싼 것을 잔뜩 갖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있을 곳에, 귀한 것에 나름의 개인적인 가치를 담아 제자리를 찾아주었을 뿐이다.
영화는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가족의 모임과 해체에는 바로 어머니의 죽음과 그녀가 남긴 수많은 그림과 조각, 은 공예품, 마호가니 가구와 유리공예 작품이 있고 이것들이 당장의 삶의 조건, 형편 때문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이자 고리이기도하다.
오르세 미술관
사실 이 영화는 오르세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올리비에 아사야스(Olivier Assayas, 1955~ ), 허우 샤오시엔(Hou Hsiao hsien, 1947~ ), 짐 자무쉬(Jim Jarmusch, 1953~ ), 라울 루이즈(Raoul Ruiz, 1941~2011) 등 4명의 유명영화감독에게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를 제작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물론 이 제안은 미술관의 재정적인 문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빨간 풍선>(Flight Of The Red Balloon, 2007)과 <여름의 조각들>이 탄생하게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배우 줄리엣 비노쉬가 두 영화 모두 주연으로 참여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영화는 불가분 미술관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흔히 그렇듯 특정기관을 홍보하고 계몽하기보다는 개인의 내밀한 수장품이 미술관의 소장품 즉 개인사가 역사, 미술사가 되는 과정을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관조적이며 내밀하게 담고 있다. 그래서 미술관은 영화촬영을 위해 많은 배려를 했다고 한다. 사실 미술관내에 촬영장비가 들어가고 수장고와 보존과학실까지 개방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희귀한 사례이다.
영화는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세세한 일상의 순간과 섬세한 감정선을 정겹고 따스하게 잘 드러내고 있다. 배우들의 연기 또한 가족처럼 호흡이 잘 맞고 남 프랑스의 빛나는 자연광이 영화의 컷마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영상미를 놓치지 않는다. 게다가 영화의 단초가 되는 어머니의 죽음은 감독의 경험과 맞닿아있다. 아사야스 감독이 영화를 막 시작했을 때 실제로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이별의 아픔과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고 진정성 있게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인상파 화가처럼 빛의 각도를 포착하는 촬영감독 에릭 고티에(Eric Gautier, 1961~ )의 탁월한 카메라워킹은 그림만큼 아름답고 정겨운 화면을 만들어낸다.
아사야스 감독은 자신이 택한 예술적 매체를 통해 자신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그의 영화는 영화라는 또 다른 사실에 몰입되어있다. 그는 여름의 조각들을 통해 “나는 예술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미술관 박물관에서 방부 처리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사실 미술관 박물관 안에 있는 문화재 미술품은 동물원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들의 가치의 전이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삶이 역사가 되듯 그들 자체가 각각이건 동시대를 관통하는 미술품이 집합을 이룰 때 건 시대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점에서 각각 그들의 가치가 생겨나는 때문이다.
사실 미술관이란 미술박물관으로 지나간 시대의 기록과 보존이라는 미술관의 사명과 이를 통해 문화라는 사유물 또는 미시적인 개개인의 삶이 공공재로 화하는 곳이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일상사와 미시사가 역사학의 주요관점으로 부상하면서 미술관의 시각도 변화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와 개인의 대두 그리고 개인의 삶의 깊이를 아르누보와 병치시킨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선택은 탁월했다. 그는 미술관과 개인 그리고 일상과 삶의 사이에서 가족의 의미, 추억의 자리, 삶에서 남는 것, 또 남기는 것들을 마치 유물처럼 잔잔하면서도 진지하게 다룬다. 누군가는 떠나고 그 자리에 남은 물건들 그리고 남은 것들을 두고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와 새로운 세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순히 물건이라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온다. 내가 떠난 자리, 나의 삶의 찌꺼기로 인해 다음세대들이 불편하다면 글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조바심이 인다. 하지만 그들에게 내가 ‘아르누보처럼 아름답게’ 남고 싶어 하는 욕심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은 인간인 때문일 것이다.
사실 프레드릭은 어머니 엘렌의 유지대로 삼형제가 나누어 유산을 남기고 기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아마 이건 우리 모두가 동의할 거야. 폴 베르티에의 전통과 이 집은 살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집에 딸린 가구와 정신까지.. 자식들에게 전해주려면. 그 다음엔 우린 없어졌을 테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유지해야겠지”, “이것들과 헤어지면 너무 슬프지 않겠어?”, “휴가 때마다 여기에 모이자”고. 또 어머니를 오랫동안 보살폈던 가정부 엘로이즈(Isabelle Sadoyan 분, 1928~ )도 자신의 삶이 담겨있는 집을 떠날 생각을 하면 서글퍼진다. 장남 프레드릭이 엘로이즈에게 어머니를 기념할 만 한 물건 하나를 고르라고 하자 그녀는 꽃병 하나를 고르며 거기에 꽃을 꽂아 엘렌을 추모하며 살겠다고 한다. 모두들 애잔한 모습이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방식은 다르다. 영화의 마지막에 프레드릭의 딸 실비(Alice De Lencquesaing분, 1991~ )는 친구들을 모아 할머니의 유산이 떠난 집에서 클럽처럼 큰 파티를 연다.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몰려들고 십대들은 락 음악에 몸을 싣는다. 그녀는 말로만 전해들었던 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추억이 산적한 할머니의 집에서 홀연히 빠져나온다. 언뜻 십대의 철없는 반항의 몸부림 정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녀는 할머니가 폴 할아버지와 지냈던 그 장소로 자신의 남자친구를 데려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난다. 이렇게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이어진다는 듯이 말이다.
어머니의 유산은 형제들의 처지와 입장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지속되나 결국 이들은 상속세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그림과 아르누보풍의 살림살이를 오르세에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이렇게 기증을 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받아 많은 상속세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 때문이다. 결국 세금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의 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한 경우 그 작품을 기증함으로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다. 즉 세금을 작품으로 내는 셈이다. 사실 외국의 주요미술관들의 경우 대부분의 소장품이 세금을 대신하여 기증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루브르가 소장한 베르메르(Johannes Vermeer, 1632~1675)의 ‘레이스 짜는 여인’도 로쉴드가문이 상속세를 대신해 기증한 것이다. 파리의 피카소미술관은 유족들이 상속세대신 상속받은 작품의 일부를 정부에 기증했고 이 기증받은 작품을 토대로 만든 것이다. 또 미국이나 유럽의 중요미술관 소장품을 살펴보면 미술관이 직접 구입한 것보다 기증받은 작품들이 90%이상을 차지한다. 서양의 기증문화가 공연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서양은 이렇게 개인의 재산인 시대의 흔적이자 역사인 미술품을 공공재로 환원시키는 방법으로 세제감면이라는 도구를 고안해 낸 것이다.
베르메르 <레이스 짜는 여인The Lacemaker> 1669-1670 유화 23.9x20.5cm. 루브르미술관
사실 집에서 꽃을 꽂던 꽃병이, 전화를 받고 편지를 쓰던 책상이 미술관에 전시되면 어머니의 유품은 이제 더 이상 가족과 개인의 서사와 추억을 떠나면 더 이상의 생명력을 잃게될 것이다. 그러나 미술관은 그 과거의 기억들을 조사할 것이고 그 속에 담겨진 의미들을 모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가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부여하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된다. 그리하여 어머니 엘렌의 폴 베르테에 와의 사랑과 추억과 기억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의 도구는 이제 미술품이 되어 순회전이나 기획전에 선보이면서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