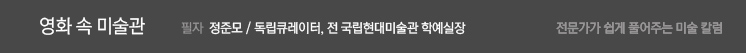영화 <여름의 조각들>(L'Heure D'ete, Summer Hours, 2008)
글/ 정준모(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삶과 삶의 찌꺼기
최근 부음소식이 부쩍 잦다. 나이 탓일 게다. 연전에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모셔야 했다. 나이드시면서 가급적 단촐한 삶을 사셨다고 생각했던 어른들의 세간을 정리하면서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낡은 액자와 서랍 속 작은 열쇠 하나까지 소중한 기억이고 추억의 실마리가 되었다. 세간을 정리하는 시간보다 그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영화 <여름의 조각들>(L'Heure D'ete, 2008)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어머니의 죽음 후에 유품을 정리하고 살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겪는 삼형제의 갈등과 그 화해의 방법을 그리고 있다.
유일하게 프랑스에서 살고 있는 큰 아들 프레드릭(Charles Berling 분, 1958~ )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매년 때가 되면 가족들이 이 집에 모여 추억을 이야기하고 왁자지껄 떠들며 상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신들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지금의 아이들이 또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자신들을 기억하고 그 추억을 전달하고 이어가는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한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 사는 동생들 생각은 다르다. 생각과 현실의 차이도 크지만 어머니가 남긴 삶의 흔적들을 두고 이들은 고민하고 방황하고 조금은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을 보면 사람들의 삶이란 동서양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너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프랑스 남부 시골이 떠오르게 하는 햇살 가득한 바람과, 연초록 숲 그리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는 빛 사이를 뛰는 아이들로 영화는 시작한다. 바로 할머니 엘렌(Edith Scob 분. 1937~ )의 75세 생일을 맞아 집에 모인 그녀의 세 자녀, 프레데릭과 아드리엔(Juliette Binoche 분, 1964~ ) 그리고 셋째 제레미(Jeremie Renier 분, 1981~ )의 가족들이다. 큰 아들은 파리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딸은 뉴욕에 살면서 보석, 장신구 디자이너로, 셋째는 베이징에서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운동화를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화가인 삼촌 폴 베르티에(Paul Berthier, 1822~1912)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서 살았지만 타고난 예술적 감각을 갖추었고 나름의 격을 중시했다. 그래서 그는 책상 하나, 화병 하나 그리고 사소한 생활도구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아닌, 적어도 최소한의 삶의 질,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살려주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 공예가들이 만든 세간살이들을 사용했다. 하지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 자식들에게 짐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때문일까. 생전에 이것들을 정리하고 싶어 했지만 자식들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는다. 어렵게 온 가족이 모인 자신의 생일날 사후에 자식들에게 부담과 갈등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고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지만 자식들은 어머니의 말은 들은 체 만 체 무엇이 바쁜지 모두들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고 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 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다. 어머니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지만 자식들은 막연하게 먼 훗날일이라고 생각했었다. 막상 어머니의 집과 유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그들은 생각지 못했던 갈등을 겪게 된다. 사실 그녀의 유품 중에는 뛰어난 화가들의 그림과 가구 그리고 생활용품들이 마치 미술관처럼 집안의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19세기 중반 동양의 산수화처럼 풍경을 주제로 삼았던 바르비종파(École de Barbizon)의 대표적인 화가로 신고전주의에서 근대 풍경화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한 코로(Jean-Baptiste-Camille Corot, 1796~ )의 풍경화를 비롯해서, 독특하고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를 그린 상징주의(Symbolism)의 선구 르동(Odilon Redon, 1840~1916)의 마가렛 꽃, 아름답고 품위 있는 아르누보(Art Nouveau)풍의 생활용품 등, 즉 살림살이들이 이 영화의 또 다른 축을 이룬다.
코로 The Road to Sevres 1858-59, 유화
영화 중 코로의 그림을 아들에게 설명하는 큰아들 프레데릭
르동 (1840-1916) <마가렛 꽃> 1901, 템페라 파스텔, 123x149,5cm, 오르세미술관
이 물건들은 어머니에게는 귀한 삶이었고 자식들에게는 애틋한 추억이지만 손자들에겐 별 의미 없는 물건일 뿐이다. 생일날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어머니는 혼자 말한다. “내가 떠날 땐 많은 것들이 함께 떠날 거야”라고. 그리고 “이젠 아무도 재미있어 하지 않는 일들만 남을 것”이라고.
루이 마조렐의 책상
George Jensen, Baby Blossom Coffee and Tea Set 1905
Antonin daum vaso tulipani 1910
어머니는 코로의 그림이 걸려있는 거실에서 루이 마조렐(Louis Majorelle, 1859~1926)의 식물문양이 돋보이는 아르누보의 상징인 마호가니 재질의 오르키데 책상(Bureau Orchidées, 1859, 가죽, 도금, 자단, 아카시아 목재, 마호가니, 청동, 95x170x70cm, 오르세미술관 소장)을 사용하고, 비엔나 공방(Wiener Werkstatte)에서 분리파양식(Sezession)의 가구를 만든 건축가 조셉 호프만(Josef Franz Maria Hoffmann,1870~1956)의 수납장에 어린 시절 아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관해 놓았다. 이름 없는 야생화라 할지라도 유리공예로 유명한 펠릭스 브라크몽(Felix Bracquemond,1833~1914)이나 수잔 랄리크(Suzanne Lalique Haviland, 1892~1989), 앙토넹 돔(Antonin Daum, 1864~1931)의 화병에 꽂아 식탁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차 한 잔을 마셔도 단순한 선이 되려 장식적인 절제된 은공예가 조지 젠슨(Georg Jensen, 1866~1935)이 만든 차 세트여야 했다. 어머니는 장신구 디자인을 하는 줄리엣 비노쉬(Juliette Binoche, 1964~ )가 연기한 딸 아드리엔에게 이를 주고 싶어했다. 이런 어머니 앞에서 딸은 1830년 설립된 크리스토플(Christofle) 사의 연꽃문양 은쟁반을 들고 어린 시절 비오는 날, 연잎이 쟁반에서 피어나던 추억을 어리광부리듯 이야기한다. 이런 세간살이들은 요즘 한국에서는 유명 백화점의 명품코너에 나가야 만날 수 있는 물건들이지만 사실 이런 공예품들은 당시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에게는 일종의 필수품이자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예의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증해주는 표상이라고 생각했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