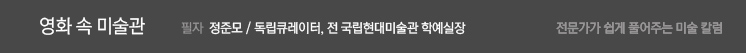글/ 정준모(미술비평, 문화정책)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67)가 시와 미의 궁극적인 기능의 하나는 카타르시스 즉, 마음의 정화라고 했던가? 하지만 이 영화에서 페이지나 듀이 정도를 제하면 이런 순진한(?) 생각을 지닌 인물은 거의 없다. 도를 넘는 노출수위와 성적인 묘사를 곁들여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예술동네의 자유분방 또는 일탈 아니면 문란(?)함을 보여주려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보는 또는 상상하는 것처럼 미술동네사람들이 헤픈지(?)는 글쎄다. 물론 영화 속에서 조기성공(?)한 유명 예술가로 등장하는 조는 성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그는 작품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콜렉터의 아내, 딜러, 비서, 여성작가 등등 모든 여성들과 성적 복잡계를 구성한다. 그에게 있어서 작품이나 스튜디오는 여성을 유혹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는 매개물에 불과하다. 그는 작가노트를 쓰다 “나의 작품은....이런 빌어먹을 작품.”라며 쓰기를 중단할 정도로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작가이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신도 연민도 긍지도 없는 단순하게 시장논리 속에서 스캔들과 만들어진 유명인사, 화가에 불과하다.
그래서 영화는 오늘날 최고 최대의 핫 아이템으로 등극한 ‘제대로 줄 하나 바로 그을 줄 모르는’ 영국의 젊은 작가들(yBA:Young british artist)의 실상을 드러내거나 또는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사실 영화는 2009년에 제작되었지만 영화 속 시대적 배경은 1996~8년, 런던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들에게 현대미술이란 잭 팟을 터뜨리게 해주는 게임인 동시에 서로 누가 어느 것이 더 엽기적이며 충격적인가를 경쟁하는 장치이다. 연인과 함께 자다 일어난 침대가 작품이 되고, 참혹한 화재현장을 재현하거나, 노골적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것들이 작품이 되는 세계이다. 미술은 2차원이나 3차원을 뛰어넘어 미디어나 또 다른 충격적 매체를 통해 표현되면서 전통적인 미술의 영역을 뛰어넘는다. 여기서 밥은 비서인 페이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신체내부에 있던 쌍둥이 기형조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적축물을 대미언 허스트(Damien Hirst, 1965~ )에게 보내고 허스트는 이를 포름알데히드에 넣어 작품을 만들어 선물이라고 준다.
영화에 등장하는 미술가 조도 그렇고 레즈비언인 비디오아티스트 일레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의 작품에는 감동이나 카타르시스는 장식이나 사치에 불과하다. 오직 쇼킹과 충격만이 목적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배신도 미덕이 된다. 아트의 화랑에서 5년간 일하며 제법 솜씨있는 딜러로 성장한 베스는 아트의 단골손님 밥의 도움으로 어느 날 그를 떠나 자신의 화랑을 열고, 무명의 일레인은 첫 전시의 기회를 얻자마자 자신의 전시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듀이를 배신하고 화랑과 직접거래를 하기로 한다. 게다가 그는 이런 일로 낙담한 듀이의 자살 장면을 자신의 비디오 작품에 담아 쇼킹한 장면을 선사한다. 이 장면은 시종일관 자신의 섹스편력기와 다름없는 작품(?)의 마지막에 갑자기 누군가가 차 지붕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큰 소음과 함께 투사된다. 그녀의 자서전적 작품인 비디오의 마지막 피날레를 자신의 배신으로 인해 죽음을 택한 이의 마지막 장면으로 마감을 한 것은 왜일까.
영화에 등장하는 미술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이들은 작품에 대한 존경이나 애정보다는 오직 성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또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배신을 서슴지 않고, 사랑도 비즈니스의 일부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일탈이 가능하다는 듯 자유분방하다.
이런 분방함은 전시 오프닝 파티에서 물고물리는 남녀관계를 통해 또 다른 긴장을 낳고 오프닝 파티에서 돌아온 제인은 그 자리에서 밥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이에 쿨하게 이혼을 수락하는 밥. 하지만 돈으로 위자료는 줄 수 있지만 자존감 그 자체인 그림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는 소장한 그림을 팔아 돈으로 위자료를 주기로 한다. 이렇게 밥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싸면 다 좋은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 여기는 배금주의의 상징이 된다. 이들에게 미술품이란 물욕의 상징이자 허영의 대체재이다.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밥의 소장품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하다. 데미안 허스트의 스핀페인팅이 거실을 한 부분을 차지한다. 데미안 허스트는 yBA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영국 현대미술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중심인물이다.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송아지나 돼지 등의 사체를 절단해서 넣은 작품으로 미술계와 관람객들에게 쇼크 그 자체를 던짐으로서 일약 거부, 거장의 반열에 오른 그는 무관심과 냉소적인 태도로 끔찍한 살육의 현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이면에 어려 있는 숭고함과 비장함으로 죽음에 대한 경고와 성찰을 불러일으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업적인 스캔들리즘에 편승한 기획된 이벤티스트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는다.
이렇게 속고 속이는 또는 뻔한 작품을 대단한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전세력들이 현대미술의 가치를 믿으라고 하는 듯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1963~ )의 네온작품 <트러스트 미>(Trust ME)가 밥의 등 뒤에서 빛을 발한다. 삶과 예술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의 작품은 자신의 삶의 한 부분을 뚝 떼어다 작품이라고 말한다. 또 관객들에게 돌연변이, 기괴함, 반전, 능욕을 주어 최대한 불쾌한 작품을 만드는 제이크와 디노스 채프먼형제(Jake and Dinos Chapman)의 코가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닮은 두상이 영화 속 성의 비중을 보여준다.
또 고급문화라는 심오함 속에 자리한 대중문화의 천박함과 부박함이 공존하는 존 커린(John Currin, 1962~ )의 <브라 숍>(Bra Shop, 1997)은 이 영화의 주제와 닮아있다. 이렇게 그들의 소장품은 줄거리가 없이 소위 인기작가, 비싼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놓은 창고를 닮았다. 이는 그들의 컬렉터로서 ‘안목 없음’과 ‘돈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에 뜬금없이 1918년 제작된 브랑쿠지(Constantin Brancusi, 1876~1957)의 <무한주>(Endless column)가 있다. 브랑쿠지는 사실적이고 구상적인 아카데믹한 조각으로부터 벗어나 대상의 본질을 표상하는 절제된 원 형태를 창조해 낸 추상 조각의 원조로 불린다. 그의 단순한 형태로 환원된 조각은 형식주의 추상 조각의 전형으로 순수한 형태를 추구한다. 여기에 초기 개념적인 작품으로 출발해서 원색적적이고 단순한 일상용품들의 형태를 차용해서 이미지와 선, 단어, 색채 사이의 관계의 상관성을 탐구하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Michael Craig Martin, 1941~ )이, 또 일상의 장면들 특히 광란의 파티를 줌인을 통해 부분 부분을 극대화시켜 경솔하거나 소란스러운 사진작품을 제작하는 제시카 크레이그 마틴(Jessica Craig-Martin)의 작품이 수선스럽게 걸려있다. 이런 상황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92)의 인간의 얼굴과 육체를 그로테스크하게 재조합하여 인간의 폭력성과 존재적 불안감을 드러내는 삼면화(Triptych)가 미술품 수집으로 자신의 빈 곳, 부족한 곳을 채우려는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영화 속 인물들의 심리상태를 읽을 수 있다.
존 커린(John Currin) <브라 숍Bra Shop>, 1997
브랑쿠지(Constantin Brancusi) <무한주Endless column> 1918
영화 속 프란시스 베이컨 작품들
또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 제인이 훌쩍거리며 아트를 찾아갔을 때 아트의 거실에는 오늘날의 제프 쿤스(Jeff Koons, 1955~ )가 아닌 진지한 아티스트로 위치시킨 <물탱크 속 3개의 농구공>(1985)이 놓여있다. 일상의 사물을 미술관이라는 예술 공간에 끌어들여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시킨 그는 일약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후예로 인정받으며 진정한 예술가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일상의 오브제들을 확대하는 일련의 작품과 매끈한 처세술과 스타성으로 대중적인 인기와 더불어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예술가가 되어 ‘포스트모던 키치(Kitsch)의 왕’으로 등극한다. 맥락이나 주제가 없는 오직 돈이 되는 작품 아니 물건만 모아놓은 컬렉션이 아닌 ‘집적’에 불과한 작품들이 대종을 이룬다. 이런 영화 속 상황을 팀 노블(Tim Noble,1966~ )과 수 웹스터(Sue Webster, 1967~ )의 라이트 조각 작품 <$>(2001)가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리고 이렇게 상품으로 전락한 현대미술의 운명을 이야기 하듯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그라피티(Graffiti) 화가 뱅크시(Banksy)의 양손에 쇼핑한 물건들을 들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 OK>(Christo Okay, 2004)가 한 쪽 벽을 차지하고 있다.
제프 쿤스 <물탱크 속 3개의 농구공> 1985
팀 노블(Tim Noble)과 수 웹스터(Sue Webster) <$> 2001
<그리스도 OK Christo Okay> 2004
하지만 미술의 순수함, 그 정신성은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몬드리안의 부기우기에서 빛난다. 물론 영화 속 작품은 몬드리안의 원작은 아니다. 하지만 부기우기란 영화는 역설적으로 몬드리안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변화하지 않는 본질로서의 색채와 색채의 효과를 추구했던 몬드리안은 원색과 면이 조화를 이루며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취한 그림과 달리 단순한 선과 선이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간에 순도 높은 원색을 배치한 추상적인 작품에 이른다.
영화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말년작인 <브로드웨이의 부기우기>(Broadway Boo gie-Woogie, 1942~3, 유화, 127x127cm, 뉴욕현대미술관 소장)에서 제목을 빌려와 미술의 긍극적인 가치, 정신성과 오늘날 상품으로 전락한 현대미술과 대비시키고 있다. 1938년 독일이 체코를 침공하자 전쟁의 공포를 피해 몬드리안은 파리를 떠나 런던을 거쳐 1940년 뉴욕에 도착한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둑판처럼 구획되고 사각형으로 높이 솟아오른 빌딩들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어주었다. 또 도시의 생동감 넘치는 역동성은 당시 유행하던 재즈 부기우기의 선율처럼 활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기학적인 그의 그림에서 보이던 검은 색은 원색의 선으로 또 선의 중간 중간도 색면이 되어 리듬을 이룬다.
몬드리안, Broadway Boo gie-Woogie, 1942~3, 유화, 127x127cm, MoMA
영화는 미술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이 ‘돈’과 ‘성공’이 우선한다. 그런 점에서 감독은 시대착오적인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살 만해지는 것 아닐까. 그럼 점에서 좀 더 시대착오적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