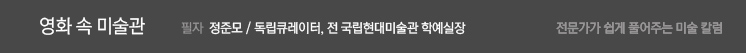정준모(미술비평, 문화정책)
요즘 영화미학의 진수처럼 떠받들어 지던 프랑스 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의 물량공세에 밀려 고전 중이다. 하지만 2012년 국내에서 개봉된 <언터처블-1%의 우정> (원제 (Untouchable, 감독 올리비에르 나카체, 에릭 토레다노 공동감독, 2011년작)은 다르다. 개봉된 이래 프랑스에서 는 물론 국내에서도 할리우드 대작들을 가볍게 제압한 작품으로 영화는 어느 영화보다 유쾌한 동시에 따뜻하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역시 스케일이나 제작비가 아니라 스토리 구성과 전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라 하더라도 계급은 존재한다.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도 실은 엄연히 계급이 존재한다. 아니 더 하다. 소위 상위 1%를 위해 인민은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구조이다.
사실 이런 계급적 불평등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동물은 모두 평등을 원하지만 평등해지는 순간 누군가 보다는 다른 것을 누리고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즉 같아지는 순간 달라지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본성(?)때문이다. 따라서 세상 어느 곳, 어느 세계이건 간에 모든 곳에는 암묵적으로 계급과 불평등이 존재한다.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필립(프랑수와 클로제 분, Francois Cluzet, 1955~ )과 ‘가난’해서 자유롭지 못한 드리스(오마 사이 분, Omar Sy, 1978~ ), 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둘이 환자와 간병인으로 만나 일어나는 일상을 그린 이 ‘극과 극’의 드라마는 자유롭고 통쾌하다가 때론 눈물을 짓게 하는 묘한 감동을 지녔다. 전신마비로 삶을 침대와 휠체어위에서 보내야하는 상위 1%, 백만장자 필립은 그를 돌봐 줄 간병인 겸 도우미를 찾는 중이다. 이때 금방 감옥에서 나온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뿐인 하위 1%, 드리스가 찾아온다. 하지만 구직보다는 실업수당을 받기위해 구직활동을 했다는 도장이 필요한 드리스는 건성으로 면접을 치른다. 하지만 필립은 건들거리는 드리스에게 강한 호기심을 느끼며, 2주 동안 자신을 보살필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고 한다. 필립의 저택 욕실에 반한 드리스도 마침내 이를 수락하면서 상위 1%와 하위 1%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다.
사실 이들 두 사람의 사이를 뜻하는 ‘언터처블’은 인도 카스트 제도의 ‘불가촉천민’(不可觸賤民)을 의미한다. 인도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신분제도로서 카스트가 있다. 승려계급인 브라만(Brahman)과 귀족계급인 크샤트리아(Kshatriya),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와 피 정복민이나 노예, 천민계급인 수드라(Sudra) 등의 4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불가촉천민은 마지막 네 번째 계급 인 최하위 수드라 계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5의 계급으로 짐승이나 다름없는 계층을 말한다.
하지만 이 두 극과 극의 사회 또는 계급의 사람들의 언터처블 한 관계가 영화가 진행되면서 좌충우돌을 통해 사람들을 웃고 울리다가 결국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영화의 제목인 ‘언터처블’ 즉 ‘누구도 손 댈 수 없는’이란 결국 이 두 사람의 우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사람의 차이는 관현악의 혁명가로 불리는 ‘베를리오즈’(Louis-Hector Berlioz, 1803~ 69)가 한 사람에게는 프랑스의 유명 작곡가로, 한 사람에게는 임대아파트 이름으로 인식되거나, 누구 눈에는 그림으로, 누구 눈에는 코피로 보이는 그림 속 ‘붉은 색’은 영화 속 ‘미술’을 통한 두 사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필립은 붉은 색 물감으로 역동적으로 그려진 추상미술 작품을 44,000유로를 주고 구입한다. 하지만 드리스는 ‘코피가 쏟아진 것’ 같은 것을 ‘그림’이라며 거액을 사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현대미술은 이런 딴 세상사람 둘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게 하기도 한다.
귀족출신인 필립의 저택에는 귀족 집안답게 많은 초상화들이 근엄한 모습으로 곳곳에 걸려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세상과는 딴 세상에서 온 드리스를 침입자처럼 째려본다. 하지만 드리스가 그림을 그리는 자신조차 무얼 그리는지 모르지만 즐겁고 신나는 그림 즉 ‘ 현대미술’을 그리면서 두 사람의 우정을 이해로 이어준다. 물론 드리스가 영화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가진 자들의 위선과 허세 그리고 남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을 비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필립이 드리스의 ‘막 그린 현대미술품’을 친척이자 파트너인 친구에게 1,1000유로에 팔아넘기면서 둘의 우정은 더욱 깊어간다.
현대미술처럼 다양한 얼굴을 가진 것은 없다. 어떤 것이던 상상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다음날 또 다른 것이 되기도 한다. 똑 같은 그림을 50명이 본다고 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고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이지만 50명이 각각 즉 50점의 다른 작품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간을 이해하는데 매우 귀한 단초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중요한 것은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눈으로 그림을 본다. 그리고 그 차이와 간격을 서로 확인하고 인정할 때 세상은 민주적이며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상호이해 가능 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세상이 된다. 그림은 특히 현대미술은 정답이 없다. 마치 문자로 인쇄된 글자가 주는 느낌과 그 글자를 소리 내어 읽을 때 느낌이 다른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림도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보는 사람에 따라 그림은 변화한다. 즉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는 자신이며 스스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현대미술이다. 하지만 현대미술의 또 다른 특징은 나에게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다른 것들끼리 만나고 모일 때, 즉 <언터처블>한 것들의 만남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나고 열어가는 힘이 되고 유머가 되기도 하다가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런 점에서 집밖으로 나와 사회에서 만큼 ‘언터처블’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드물 터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알지 못했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간다면 '현대미술'에서처럼 보이지 않거나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영화에선 그림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도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 된다. 로큰 롤의 ‘어스 윈드 앤 파이어'(Earth Wind And Fire)부터 ‘사계’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에서 등장하는 팝과 클래식 음악들은 두 사람의 ‘다름’을 ‘같음’으로 묶어준다. 영화 초반의 자동차 질주 장면에서의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셉템버’(September)를 시작으로 필립의 생일파티에서 결국 팝과 클래식은 하나의 ‘다른 음악’이 되어 영화를 완성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오는 가장 큰 이유는 실존인물들의 드라마틱한 삶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극 중 필립은 실제로 프랑스에서 샴페인회사를 경영하는 ‘필립 포조 디 보고’이며 드리스는 빈민촌 출신의 ‘애브델’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 둘의 이야기는 2003년 이미 다큐멘터리로 제작 방영된 바 있으며 이 다큐가 바탕이 되어 영화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