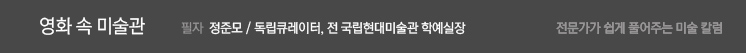이번 주 부터 "영화 속 미술관" 칼럼을 시작합니다. 미술로 영화를 읽어 보는 이번 칼럼은 다양한 영화 속에 숨어 있는 미술의 기호학을 찾고, 미술의 언어를 통해 영화 스토리의 새로운 면을 살펴봅니다. 필자 정준모 선생님은 이미 책으로 『영화 속 미술관』(마로니에 북스, 2011)를 통해 다양한 영화를 미술사적인 시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 후속작으로 이번 칼럼을 진행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미드 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 2011년작) 감독 : 우디 앨런
누구에게나 좋은 시절이 있기 마련이지만 오늘날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각인시킨 시기가 있다. 소위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최고의 여유와 풍요를 구가하던 황금시대(La belle époque)가 바로 그때이다. 프랑스로서는 치욕적인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끝난 후 제1차 세계 대전까지의 기간(1871〜1914)이다. 이 때 파리는 미술과 문학 그리고 아르누보(Art Nouveau)를 정점으로 하는 공예가 발달한 시기이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1920년대의 파리 밤거리
이 시기의 파리를 영화감독 우디 앨런(Woody Allen,1935~ )은 찬미로 일관하는 영화를 감독한다. 바로 <미드 나잇 인 파리>(Midnight in Paris, 2011)이 그것이다. 이 영화도 그의 다큐멘터리 <우디 앨런:우리가 몰랐던 이야기>(Woody Allen: A Documentary, 2011)에서 익히 본 것처럼 복잡하고 산만한 구성과 시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준다. 물론 우리는 이미 그의 영화 <에브리원 새즈 아이 러브 유>(Everyone says l Love you, 1996년>을 통해 그 구조를 익히 경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보다 더 몽환적이며 환상적이다. 그의 지나친 파리에 대한 사랑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여행을 통해 보다 행복했던 시절로 들어간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보면 어느새 소위 1920년대 낭만으로 그득했던 파리의 깊은 밤길을 걸으며 ‘파리앓이’를 하도록 이끈다.
사실 누구에게나 황금시절은 있는 법, 누군가는 “인생의 공백기였고 엄청난 고문”이었다고 술회하는 군 생활도 제대하고 술 한 잔하면서 무용담처럼 장황하게 늘어놓게 되는 것도 실은 지나간 일이기 때문이다.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 한 토막 지니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으랴만.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사람들은 언제나 오늘보다는 어제가 좋았다고 힘주어 말한다.
하지만 까칠하면서 섬세한 우디 앨런은 영화를 통해 ‘그래, 옛날도 좋았지만’ 가장 ‘좋은 시절’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고 말한다. 2011년 칸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했던 영화는 오웬 윌슨(Owen Wilson, 1968~ )이 주인공이다. 소설가를 원하면서 어쩔 수없이 생계를 위해 영화대본을 쓰는 그는 자신의 재능을 몰라주는 세상이 야속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우상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1899~1961)와 스콧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 1896~1940)가 살았던 1920년대를 동경한다.
푸조 랑듀레 184가 나타나 길에게 파티에 가자고 한다.
이런 멋진 자동차에 몸을 맡기고 얼떨결에 도착한 곳은 전설적인 작곡가 콜 포터(Cole Porter, 1891~ 1964)가 피아노 치며 노래를 부르고, <위대한 개츠비>의 작가 스콧 피츠제럴드부부가 헤밍웨이와 잡담을 하는 그곳. 1920년대 파리의 한 파티장이다. 그 후 ‘길’은 자정만 되면 버릇처럼 1920년대로 길을 나선다. 이곳에서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을 만나 작품에 대한 조언을, 당대 최고의 여성 비평가이자 소설가며 시인인 거트루드 스타인(Gertrude Stein, 1874~1946)은 그의 작품을 읽고 칭찬을 해준다. 여기에 피카소의 연인인 아드리아나(마리옹 꼬띠아르, Marion Cotillard, 1975~ )를 만나 현실의 연인 ‘이네즈’를 떠나 환상 속 사랑에 빠진다.
피카소, <목욕하는 사람(La Baigneuse)>, 1928, 파리 피카소미술관
피카소, <거트루드 스타인의 초상>, 100x81.3cm, 1906,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렇게 우디 앨런이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 1920년대 파리를 동경하고 사랑했던 모든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연 파티가 바로 <미드나잇 인 파리>이다. 이 시절 파리는 비록 제국주의침탈과 1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상에도 불구하고 인간상실의 시대에 절망한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이 욕망과 탐욕의 시대를 벗어나 만든 ‘해방구’였다. 이 시절 “선한 미국인은 죽어서 파리에 간다.”고 했던 오스카 와일드의 말처럼 특히 많은 미국의 문인, 예술가들은 파리로 떠났고 일부는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 뼈를 묻을 만큼 파리는 동경의 땅이자 예술적 열정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파리는 이들에게 시대적 아픔을 치유 아니 잊을 수 있는 낭만적 도피처이기도 했다. 그래서 수많은 카페와 바와 그리고 아틀리에를 전전하며 여는 파티는 초라했지만 매일 매일 토론과 열정으로 차려진 성찬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지식인·예술가들에게는 뜨거운 파리였지만 토박이들에게는 권태롭기 그지없는 공간이기도 했다. 영화 속 한 장면, 물랭루주의 한 바에서 로트레크(Toulouse Lautrec, 1864~1901)가 스케치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난 드가(Edgar De Gas, 1834~ 1917)에게 고갱이 한마디 던진다. “이 시대는 공허하고 상상력이 없어. 르네상스 때야말로 최고의 시대였지!”라고. 이렇게 우디는 자신의 작품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불만인 소설가를 1920년대 문화예술의 황금시대를 구가하던 파리로 보내 “지금, 여기”와 대비를 통해 ‘현실도 꽤 괜찮은 살 만한 곳’이라고 쓴 쪽지를 슬그머니 쥐어준다.
아드리아나와 길은 로트렉, 드가, 고갱을 만나 파리의 황금기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 속 황금시대 파리는 지금까지 언급한 예술가들 외에도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장 콕토, 투우사 벨 몬테, 모딜리아니, 계속해서 코뿔소를 외치는 달리와 그의 친구 영화감독 루이스 부뉴엘, 사진가 만 레이, 시인 T.S. 엘리엇, 조세핀 베이커, 쥬나 반스, 코코 샤넬 등등의 인물들이 등장하거나 대화중에 등장한다. 그래서 마치 20세기 초반을 구가한 문화예술인 인명사전 같은 느낌을 준다.
달리에게서 만 레이를 소개받는 길
또 베르사유 궁전, 루브르미술관, 퐁피두 센터, 오랑제리미술관 등 미술관은 물론 개선문과 에펠 탑, 공원, 노천카페, 꽃가게, 센 강의 다리들, 나폴레옹 광장, 물랭루주 등등이 그림엽서처럼 스쳐지나간다. 화가들도 빠지지 않는다.
오랑제리 미술관 장면
이 시절 파리로 모였던 많은 화가들 집단을 ‘에콜 드 파리’(École de Paris)라 한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 파리의 몽파르나스는 이민 또는 난민화가들의 집결지였다. 이탈리아에서 온 모딜리아니, 불가리아의 쥘 파스킨, 러시아의 샤갈, 폴란드의 키슬링, 고틀리브, 자크, 리투아니아의 수틴, 막스, 반드, 우크라이나의 민싱 등이 그들인데 이들은 당시 파리를 중심으로 번졌던 큐비즘 작가들과는 인간적인 교류는 흔했지만 작품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자유롭게 스스로의 작업을 독립적으로 제작하던 이들이다. 따라서 특징적인 유형이나 경향성을 지니지 않은 각기 다른 작가들의 공동체 또는 집합체 였던 셈이다. 이들은 동시대인들인 동시에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유대인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또한 멜랑콜릭한 정서와 반항적인 기질, 감상적인 기질과 취향도 같았던 이들은 로맨틱하고 서정적이거나 우아한 애수가 함께하는 섬세한 관능미를 화폭에 담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열정을 자제함이 없이 화폭에 펼쳐내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화가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작품의 바닥에는 모두 불안과 고뇌라는 공통점이 도사리고 있었다. 여기에 샹송이 보태지면서 분위기를 더욱 끈적거리게 한다.
69회 골든 글로브 각본상과 84회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가를 올린 <미드나잇>의 메시지 하나. 포크너(William Faulkner, 1897~1962)는 “과거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우디는 말한다.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바로 황금시대”라고 말이다. 아마 우디가 한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아무튼 “예술가의 임무는 절망에 굴복하지 않고 인간의 삶의 허무에서 해독제를 찾아주는 것”이다.